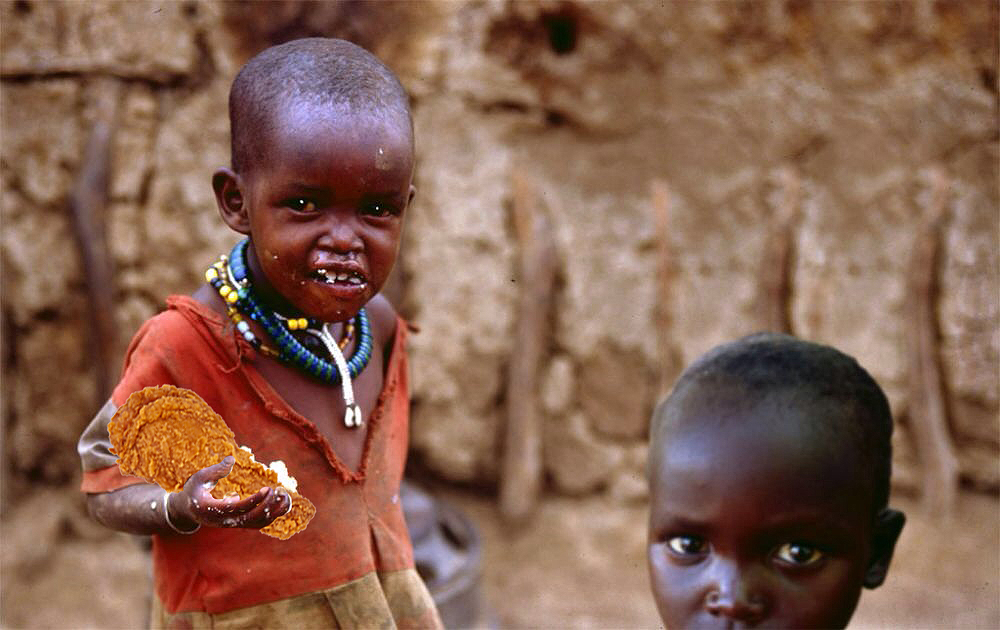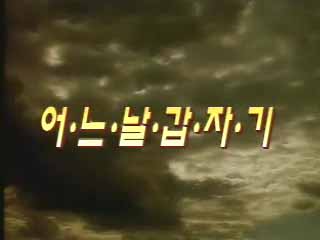일반적으로 순우리말이라고 하면 한자와는 무관하고
고조선때부터 내려오던 순 우리민족만 쓰는 말이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순우리말은 꼭 우리만 쓴말이 아닌 한자에서 유래된 순우리말도 많이 있어 이건 한자어와 다른 개념이고
순우리말의 범주에 포함되는 우리말들이다.
가난
‘어려울 간(艱)’과 ‘어려울 난(難)’을 합친 한자어 간난(艱難)인데, ‘가난’으로 발음이 바뀐 순우리말이다
감자
감저(甘藷)는 ‘달 감(甘)’과 ‘고구마 저(藷, 또는 사탕수수)’가 합쳐진 말로 ‘감자’로 바뀐 우리말이다
갑자기
한자어 급작(急作)에 접미사 ‘이’가 붙어 ‘급작이’가 되었다가 ‘갑작이 〉 갑자기’로 바뀐 우리말이다
강냉이
강남은 장강(양자강)의 남쪽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자주 쓰였던 말이다 .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콩을 ‘강남콩 〉 강낭콩’이라 일컫듯이 ‘강남(江南)+이’의 말이 ‘강냉이’로 변하여 ‘옥수수’란 뜻으로 쓰이게 된것이다.
고추
고초(苦椒)가 에서 변한말이다.
초라는건 산초나무 열매를 가리키는데
왜 ‘매울 신(辛)’을 써서 신초라고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고(苦)에 ‘고생한다’, ‘힘들다’는 표현이 있어 처음 매우 강한 매운맛을 보고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른다.
곤두박질
처음보고 아 이거 사자성어 아니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상 보면 사자성어에서 유래된 말이지 사자성어는 아니다.
바로 근두박질(筋斗撲跌 혹은 筋頭撲跌)이 유래했다.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와 함경도같은 북쪽지방에서는 곤두란 ‘거꾸로’라는 의미로 쓰였다고해
지금도 쓰일지도 모른다.
과녁
옛날에는 화살의 표적판을 가죽〔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혁(貫革)이라고 불렀다.
역시 관혁을 빠르게 부르다보니 그것이 ‘과녁’으로 바뀐것이다.
과일
과실(果實)에서 유래된 말이다.
낙지
낙지는 발이 8개라는 뜻에서 ‘얽을 락(絡)’과 ‘발 제(蹄)’를 합쳐 낙제(絡蹄)가 되었고, ‘낙지’로 변음된 우리말이다.
대수롭다
대사롭다(大事-)가 변한 말인데 한자 뜻 그대로
"큰일" 이다 = 중요하게 여길만 하다 라는것이다.
‘대수롭지 않다’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롭다’는 접미사다.
도무지
도모지(塗貌紙)가 변한 말인데
도모지는 형벌의 일종으로
물을 묻힌 한지(韓紙)를 얼굴에 몇 겹으로 착착 발라놓으면
종이의 물기가 말라감에 따라 서서히 숨을 못 쉬어 죽게 되는 무서운 형벌이다.
끔찍한 형벌인 ‘도모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도무지’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 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의 뜻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거다. ㄷㄷ
돈
조선시대에나 지금이나 전(錢)은 ‘전’으로 발음되지만, 고대에는 ‘돈’으로 발음되었다한다.
열 푼의 10곱이 1돈인데, 이때의 ‘돈’이 곧 ‘錢’이다. 최근에는 동몽골과 만주 지역에서는 조개를 돈이라고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조개를 화폐로 쓰던 고대에 형성된 말이라고도 주장하기도한다.
마고자
저고리 위에 입는 방한복을 ‘마고자’라고 한다.
이 말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이 말을 탈 때에 입던 마괘자(馬掛子)에서 온 것으로, ‘마고자’로 발음이 변한것이다.
망나니
망량(魍魎)에서 유래된 말인데 본래는 괴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다가 어느순간부터 죄인의 목을 베던 회자수(깩子手)의 뜻으로 의미가 변해버린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망냥이 〉 망냉이 〉 망나니’로 변하여 쓰이게 된것이다.
참수인의 순 우리말인셈이다.
매정하다
‘무정(無情)하다’가 변한 말로
보통 매정하다 자체에서 매정이 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추
배추는 한자어 백채(白菜)에서 왔는데
중국어 발음에서 "바차" 가 조선시대에 와서 "배추"로 변한것이다.
그리고지금까지 쓰이는 말이다.
불가사리
불가살(不可殺)이 변한 말이다.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뜻이다.
사진은 같은 발음인 불가사리 캐릭터 뚱이다.
사냥
산행(山行)의 옛 발음이 변해 ‘사냥’으로 쓰이게 되었다.
사진은 올림포스 가디언에 나오는 사냥과 순결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이다,
사랑
‘상대하여 생각하고 헤아리다’의 뜻인 사량(思量)이 변해 ‘사랑’이 된것이다.
서랍
책상의 ‘서랍’은 한자어 설합(舌盒)에서 변음된 말이다.
성냥
석류황(石硫黃)에서 유래한 말로
통일신라에서는 ‘석류황이라 불렸다가
고려시대 와서 석뉴황이라 불렸고
조선 전기까지는 성뉴황으로 불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성냥으로 음절마저 3음절에서 2음절로 줄어든 순우리말이다.
수저
시저(匙箸)가 변한 말로
사람들이 수저하면 숟가락만 생각하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술래
순라(巡邏)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는 야간에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사람이나 말의 통행을 감시하던 일을 하던 사람을 뜻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발음이 바뀌어 ‘술래잡기’의 ‘술래’가 된것이다.
시금치
채소 ‘시금치’는 한자어 적근채(赤根菜)의 근세 중국어 발음에서 변한것이다.
또한 ‘채(菜)’는 우리말에서는 ‘김치, 상치, 배치’ 등과 같이 거의 ‘치’로 변음되어 쓰인다.
시시하다
‘세세(細細)하다’가 변한 말이다.
한자어로는 ‘사소(些少)하다, 사세(些細)하다, 미미(微微)하다’와 같은 뜻이다.
쓸쓸하다
일게이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중 하나이다.
‘슬슬(瑟瑟)하다’가 변한 말로 ‘적적하다’와 같은데, ‘적적하다’ 역시 적적(寂寂)이란 한자어에서 온 말이다.
양치
양지(楊枝)가 변한 말이다.
양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리키는데
고려 시절부터 버드나무 가지를 이쑤시개로 사용한 데서 생겨난것이다.
이게 훗날 양치질의 어원이 되는것이다. ㅎㅎ
번외
몽골어와 만주에서 영향을 받은 언어들
호주머니
호주머니는 옷의 일정 부분에 헝겊을 덮어 만든 주머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식의 주머니가 들어온게 병자호란 이후다.
그전까지는 우리는 주머니를 포대나 헝겊에 싸서 들고 다니는 형식이였다.
만주족 풍습이 유입되면서 이때부터 바지에 주머니를 내기 시작한것이다.
병자호란할때의 호와 호주머니 할때 호
같은 호(胡)다.
마치며
한자에서 유래한만큼 발음에서 변음된것들이 상당히 많다보니
우리가 일생활하면서 발음만 들어보면 한자어인가? 의심이 들정도다.
반대로 한자어 같은데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도 있으니 재밌는거 같다.
'상식 및 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 나라 팔아먹은 8명의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6.06.04 |
|---|---|
| 중국의 살인 청부 어플 (0) | 2016.06.03 |
|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에 대하여 (0) | 2016.06.03 |
| [정보] 이로운 마약 (0) | 2016.06.01 |
| [스압,정보] 세계 군사비 TOP 15 (0) | 2016.06.01 |